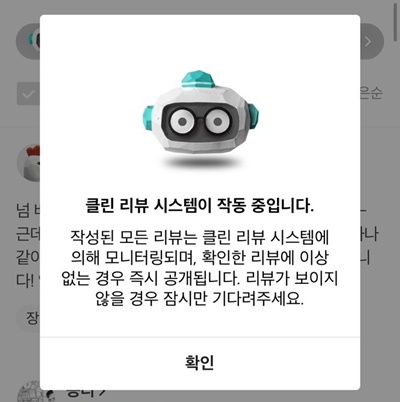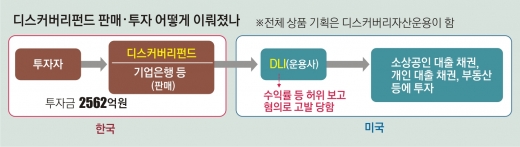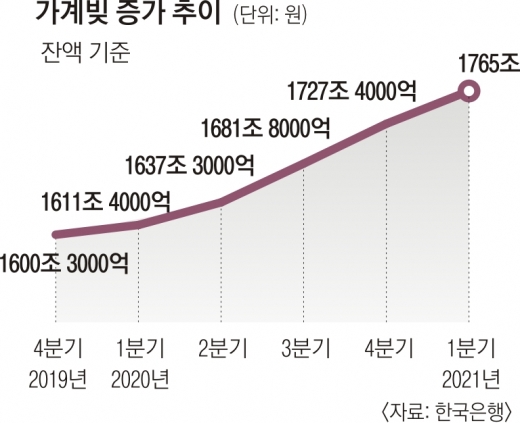13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은 “말리면 맛있다” 못 말리는 맛의 고수 편으로 꾸며진다.
햇살 한 줌, 바람 한 자락 머무는 자리마다 맛은 단단해지고, 향은 짙어진다. 오래 두고, 오래 먹기 위해 만들어진 건조 음식은 세월을 건너 이어져 온 저장의 지혜이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 빚어낸 생존의 기술이다.
세월이 깃든 풍미가 더해진 건조 음식들. 생생한 날것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더 깊어진 맛과 인생이 만든 단단한 이야기들이다.
■ 햇살과 바람의 시간, 맛도 인생도 깊어진다-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충청북도 보은군 ‘어부동’. 대청댐이 들어오며 물이 차올라, 농사 대신 고기잡이에 나섰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다. 열 가구 남짓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의 이장 김경애(54) 씨. 아직 이장이라 부르기엔 젊은 나이다. 그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15년 전. 어머니 박순직(80) 씨가 시력을 잃자, 경애 씨는 두 아이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주말엔 아이들을 찾아가고, 평일엔 어머니를 돌보며 지냈다. 익숙지 않아 다투는 날도 많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속도에 맞춰 살아간다고.
밭에는 늙은 호박, 무, 무청, 고춧잎이 익어가고, 수확한 채소들은 볕 좋은 날마다 말려 겨울을 준비한다. 생것으로는 금방 시들던 채소들이 물기를 잃고 쫄깃해지면 새로운 음식이 된다. 말린 가지는 다진 고기와 함께 솥에 넣어 가지 솥밥이 되고, 고춧잎과 무말랭이는 반찬으로 올라온다. 무청은 시래기가 되어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메기매운탕 위에 얹히고, 달큼하게 말린 호박고지는 구수하게 볶아낸다. 어머니를 위해 한 그릇에 담아내는 솥밥은 딸이 가장 자주 만드는 메뉴다. 경애 씨는 농사 팁과 어머니에게 배운 조리법을 블로그에 빼곡하게 기록한다. 냄새와 촉감으로 익은 정도를 짚어내는 어머니의 감각이 글과 사진으로 남는다. 생생했던 채소들의 시간이 지나도, 말려 남은 맛과 향은 겨우내 보은의 밥상을 따스하게 채운다.
■ 더 맛있고, 귀하게! 말림의 미학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을 병풍처럼 두른 이 마을에서 박자연(33) 씨와 동생 박정원(29) 씨는 흑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의 뒤를 이어, 생고기보다 귀하다는 ‘한국형 하몬’을 만든다.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하면 잘 팔리지 않는 고기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찾아낸 해법은 염장·건조·숙성 방식의 생햄이다.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염장해 2년에서 길게는 4년 동안 천천히 말린 발효생햄. 겉만 말리면 속이 상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귀한 맛이다. 짠맛을 줄이고 흑돼지 지방의 고소함을 살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것이 이들의 방식이다. 두 형제는 “가업을 승계(承繼)하는 대신 계승(繼承)한다”라는 마음으로 생햄을 만든다.
■ 남원의 맛을 말리다: 두 장인이 빚어낸 ‘하몬’과 ‘어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하몬 형제의 이웃 양재중 셰프는 숭어알을 염장해 말리고 숙성시키는 전통 어란을 잇는다. 참기름 대신 천연 밀랍으로 어란을 코팅해 산패를 막는 방식은 세월이 만든 노하우다. 흑돼지 생햄 위에 어란을 올린 하몬 초밥, 곶감 속을 채운 하몬 곶감말이, 찹쌀과 어란으로 빚은 어란 떡, 한 장씩 말린 어란 연자자반, 얇게 썬 생햄을 곁들인 하몬 샐러드, 오래 씹을수록 고소한 흑돼지육포까지. 말리면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 남는다. 두 남자의 생햄과 어란도 그렇게 시간을 품고 깊어진다.
■ 누가 좀 말려줘요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법성포 칠산바다 바람이 스치는 덕장 앞에서 황금빛 조기들이 해풍에 천천히 마르고 있다. 김성진(65) 씨는 50년 넘게 굴비를 말려온 사람이다. 이른 아침부터 염장한 조기를 줄에 꿰고 덕장에 거는 일은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래서 굴비를 말리는 날이면 형제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형 김종진(77), 김남진(67), 동생 김해진(62), 막내 김옥순(58) 씨까지, 백수(百壽)를 바라보는 이영임(98) 씨가 굴비를 엮어 키워낸 아들딸들이다. 예전에는 볏짚으로 굴비를 엮어 걸었지만, 요즘엔 위생을 위해 재료가 달라졌을 뿐 손끝으로 매듭을 정리하고 바람의 방향과 건조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감각이 필요하다. 줄줄이 엮인 굴비가 덕장에 걸리고 바람에 서서히 물기를 잃어 갈수록 맛과 향은 깊어진다는데.
98세의 노모는 사다리를 타고 항아리 속 보리굴비를 묻어두던 옛 시절을 추억한다. “굴비 한 마리 팔아 자식 아홉을 키웠다”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던 시절. 겨울이면 굴비를 널고, 봄이면 보리와 함께 항아리에 켜켜이 채워 넣었다. 그 기억을 자식들은 지금도 몸으로 이어가고 있다. 덜 짜고, 기름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며 살이 단단해지는 굴비는 그냥 쪄서 먹는 보리굴비찜, 매콤하게 무친 고추장굴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 건민어탕, 꾸덕꾸덕하게 말린 풀치를 양념해 졸인 풀치 조림이 된다. 굴비 한 마리엔 칠산바다의 바람, 볕, 소금, 그리고 9남매가 버텨온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