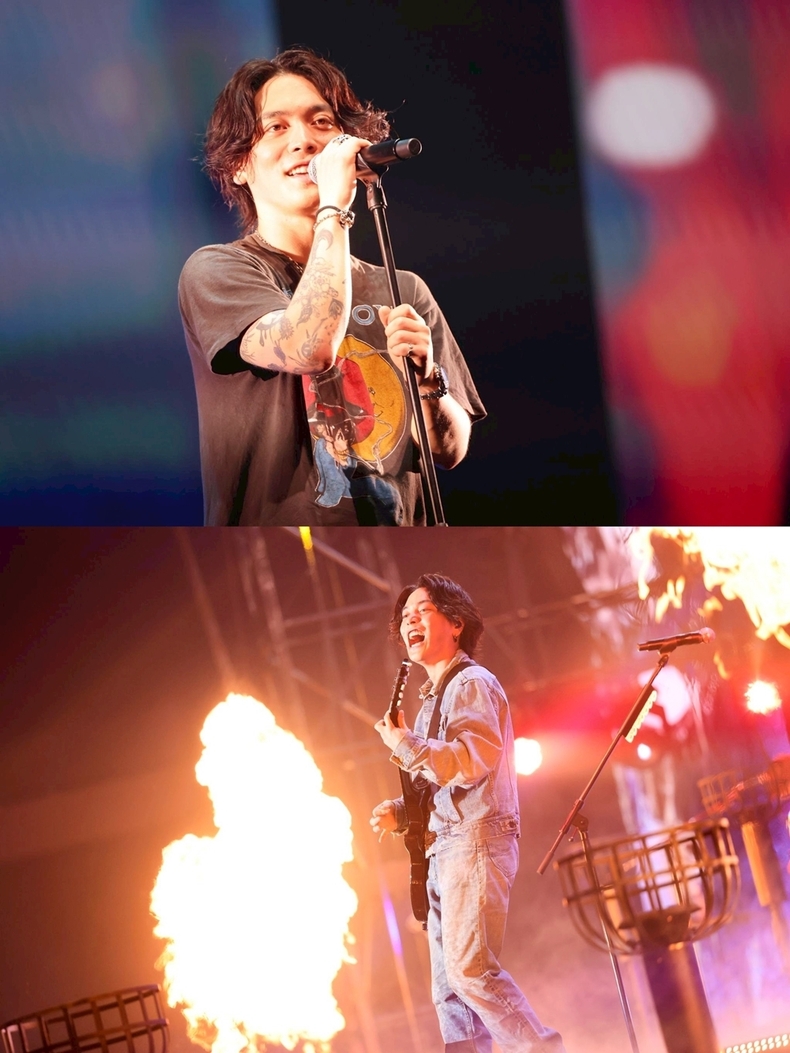◆ 한 권의 책에 담긴 35년의 기록, 가문의 흥망을 증언하다
19세기 조선 권력의 핵심에 있던 풍양(豊壤) 조씨(趙氏) 가문의 일원, 조기영(趙冀永, 1781~1867).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치사봉조하(致仕奉朝賀)의 영예를 누리며, 당대 최고 명문가답게 영예로운 삶을 살았다.

그가 남긴 한 권의 필사본 『신종록(愼終錄)』은 한낱 한 개인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1832년부터 1867년까지 무려 35년에 걸쳐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상례(喪禮)의 전 과정을 집대성한 가문 경영의 비망록이다.
책은 1832년(순조 32) 동짓달 스무이튿날,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낸 부친 조진선(趙鎭宣)의 죽음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듬해 아내 경주 김씨의 상(喪)을 치른 기록이 뒤따르고, 1836년(헌종 2)에는 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면례(緬禮)가, 그리고 1867년(고종 4)에는 조기영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후손이 상례의 전말을 기록하며 책이 완결된다.
이처럼 4차례의 큰 의례를 관통하는 『신종록』은, 죽음을 통해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계망을 재편하며, 그 무형의 자산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했던 한 시대 지배층의 치밀한 전략서라 할 수 있다.

◆ 아들의 영달(榮達), 아버지의 추증(追贈)으로 완성되다
『신종록』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지점은 기록자인 조기영의 관직 생활과 망부(亡父) 조진선의 사후 추증(追贈) 과정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조진선은 사망 당시 전직이 나주목사(羅州牧使)에 불과했으나, 아들 조기영의 영달(榮達)에 따라 그의 사후 관직 또한 상승을 거듭했다. 아들이 동돈녕(同敦寧)으로 있던 1833년에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추증된 것을 시작으로, 대사헌(大司憲) 시절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시절에는 좌찬성(左贊成)으로, 그리고 아들이 관직에서 은퇴한 1860년(철종 11)에는 마침내 국정 최고 직위인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 과정은 『신종록』의 표지 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1832년 상례 기록의 표지에는 “임진년 증이조참의공(贈吏曹參議公)”이라 적혀 있어 추증 직후의 사실을 반영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836년 부모의 면례 기록이다.
표지에는 “병신년 면례 증영상내외분(贈領相內外分)”이라 쓰여 있는데, ‘영상(領相)’, 즉 영의정 추증은 1860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 표제는 조기영이 20여 년이 지난 뒤 과거의 기록 위에 가문의 최종 영예를 소급해 덧붙여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종록』이 그저 과거의 기록이 아닌, 가문의 영광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확인하는 살아 있는 문서였음을 증언한다.

◆ 권력의 지형도: 조문객 명단과 부의금(賻儀金)의 사회학
『신종록』의 각 상례 기록은 일정한 구성을 따른다. 먼저 의례 절차에 필요한 기물 목록을 적고, 이어 조문객의 성명과 그들이 낸 부의금 액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조문 기록을 넘어 19세기 조선의 권력 지형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세도 가문이었던 풍양 조씨의 상(喪)에는 정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부터 다양한 관계의 인물들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가문의 위상을 증명하듯 부의금 또한 상당한 액수에 달했다.
물론 조문객 중에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부의금 액수가 적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 명단과 액수는 조씨 가문과 정치적·사회적·혈연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의 총람(總覽)이자 각 인물과의 관계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즉, 이 장부는 향후 되갚아야 할 '관계의 부채'를 기록한 회계 장부인 동시에, 가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실체를 명시한 '권력의 자산 목록'이었던 셈이다.

◆ 대를 이어 계승된 기록의 정신
『신종록』의 백미(白眉)는 조기영 사후, 후손이 남은 지면에 그의 상례를 기록하며 책을 완결했다는 점이다.
앞선 세 기록의 필체와 1867년 마지막 기록의 필체가 뚜렷이 다른 것은, 상례 기록의 방식 자체가 가문의 전통으로 후대에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이다.
선조가 그러했듯 후손들 또한 상례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조문객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가문의 사회적 생명을 이어가려 했던 것이다.
낡고 얼룩진 이 한 권의 책은, 죽음이라는 가장 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공적인 위세 과시와 정치적 행위로 전환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 기록은 지배층 남성의 시선으로 재단된 것이며, 그 이면에 숨겨진 여성·하층민·노비 등 다수의 노고는 침묵 속에 묻혀있다.

그럼에도 『신종록』은 산 자의 효심과 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가문의 영속성을 위해 관계를 기록하고 경영했던 한 시대의 냉철한 합리성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