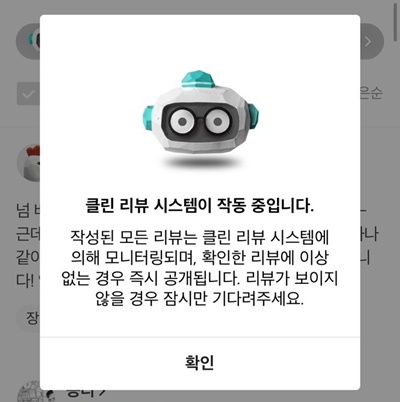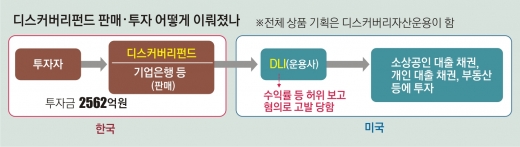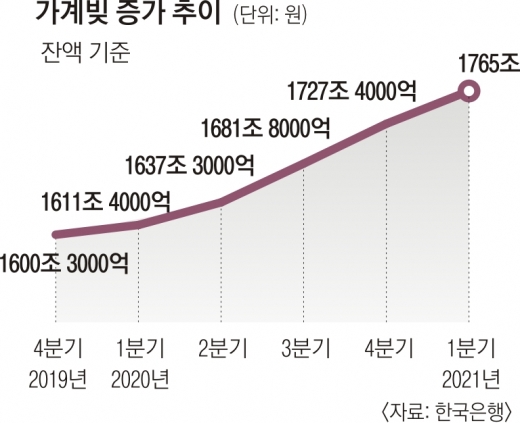주 3회, 네 시간씩 이어지는 투석은 생존의 조건이자 일상의 단절이었다. 공장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가정을 지켜온 아빠 중영 씨(49)는 신부전 판정 이후 일과 치료를 병행하다 몸이 무너졌고, 끝내 생계를 내려놓았다.
두 아이가 겨우 세 살, 한 살이던 때였다. 부부의 인연도 거기서 멈췄다. 그 후 5년, 아빠는 아픈 몸으로 두 남매의 등하굣길과 식탁, 빨래와 잠자리를 지켜왔다.
불안은 밤마다 고개를 든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곁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이 하루의 체온이 된다. 아이들을 위해 더 움직이고, 더 버티고, 내일을 꿈꾸는 이유가 된다.

열두 살 여진이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기초 연산도 버거웠던 지난날, 문제집 한 권을 다섯 번씩 풀며 덧셈에서 곱셈으로, 짧은 문장에서 단단한 문단으로 건너왔다. 틀리면 속상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지만 포기를 모르는 근성으로 한 걸음씩 세계를 넓혔다.
작년부터는 ‘아빠 돕기’가 일과에 추가됐다. 신장이 나빠 물 한 잔도 조심해야 하는 아빠를 위해 약수터를 오른다. 청소와 빨래, 밥하기도 배운다. 아직 서툴고 때로는 일이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여진이의 마음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내가 더 잘하면 아빠가 덜 힘들 거야.”
지난해 여름, 10년 만에 찾아온 신장 이식의 기회. 그러나 그 문은 병실료와 치료비 앞에서 닫혔다. 무균실 하루 수십만 원,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시점에 세 식구의 한 달 살림은 이미 바닥을 보였다.
아빠는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른 건 아이들이었다. “우리가 더 잘하면, 아빠가 덜 걱정하겠지.” 남매는 작은 일부터 손을 보탰다. 아빠는 다시 일어섰다. 투석이 없는 날이면 지인의 부탁으로 짧은 일거리를 나간다. 하루 일을 하면 며칠을 앓아눕기도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내는 아빠이고 싶다”는 마음이 몸을 일으킨다.
이 가족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오늘을 견딘다. 여진이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 아빠의 어제보다 가벼운 내일을 만든다. 아빠는 고단한 몸으로도 식탁의 따뜻함을 지키며 아이들의 불안을 대신 짊어진다.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세 사람은 안다. 포기가 습관이 되는 순간 희망은 멀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작은 루틴을 이어간다. 약봉지를 챙기고, 연필 끝을 깎고, 설거지 물을 뺀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세 식구의 내일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