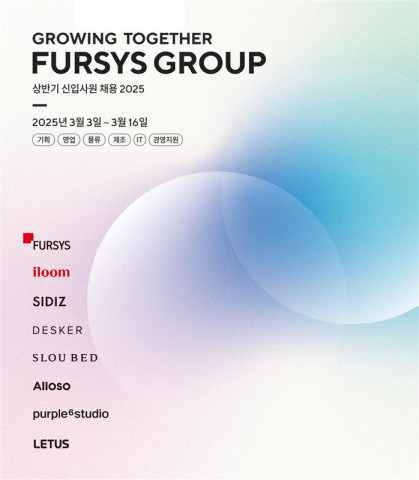‘인(仁)’이란 유교의 중심 덕목이다.
유교사회에서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이었다

임금은 인자해야 하고 정치는 인을 근본으로 해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임금은 어전에서 신하들에게 "과인이 인을 지키고 있는가, 인정을 베풀고 있는가?"를 묻고 올바른 언로를 구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지자요수 인자요산(智者樂水 仁者樂山)'이란 말은 '슬기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심성이 어진 자는 산을 좋아 한다"는 말이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한국인들은 물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여 전국 산야에 등산객이 넘쳐나는 것은 이런 전통적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세종 임금의 인정에 대한 노력은 세자 때부터 대단했다고 한다, 태종은 잠시 물러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며 그 덕목을 시험했다, 세자가 과연 훌륭한 군주가 될 재목 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였다.
세자는 매일 아침 이조판서에게 전국 지방의 굶주린 백성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구황을 첫 의제로 삼았다.
굶주린 백성이 있는가, 수해로 고통 받는 백성이 있는가, 노인으로 환과고독에 신음하는 백성이 있는가. 지방 수령들이 어버이처럼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 수령들은 파직하여 서울로 불러 볼기를 쳤다.
나라 최고 책임자가 이처럼 매일 큰 눈을 뜨고 관리들을 규찰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없는가를 살폈으니 성군이요, 현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백성 사랑이 결국 한글을 창제한 원인이 된다, 조선 백성들이 어려운 한문을 배우지 못해 문맹으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인술(仁術)은 곧 인정(仁政)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라는 뜻이다.
우리 역사상 인술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허준이다.
그는 고려 말 이후 수백 년 동안 전래된 전통 의약 지식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임진전쟁 중에도 선조의 명을 받아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붓을 놓지 않은 허준의 노고가 큰 역할을 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사명과 인술(仁術)을 서약하는 다짐이다, 기원전 4세기 인물인 그는 ‘인술의 아버지’이자 ‘영웅적인 의사’로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오늘날 의료인으로서 기본윤리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으로 널리 회자된다. ‘만약 돈이 없는 낯선 사람을 진료할 기회가 생긴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해야 한다. 그 까닭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문구에 감동이 더하다.
필자는 지난주 청주에서 출발하는 나트랑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 도중 탑승객 중 심정지 70대 노인 환자가 발생했다,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일행 중 여의사이신 대전봉키병원 강은식 원장님이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여 생명을 구했다.
손에 땀을 쥐는 시간이었다.
노인이 기적적으로 숨을 쉬자 이를 지켜 본 주변에서는 강원장님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 순간 비행기 안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멋진 순간이 되었다.
그렇다, ‘인정’이나 '인술'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인간 중심의 가치다.
나라가 혼란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형국에서도 국민들의 이런 미담은 그치지 않는다.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인정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만 한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아닌가?
※ 외부기고 및 칼람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