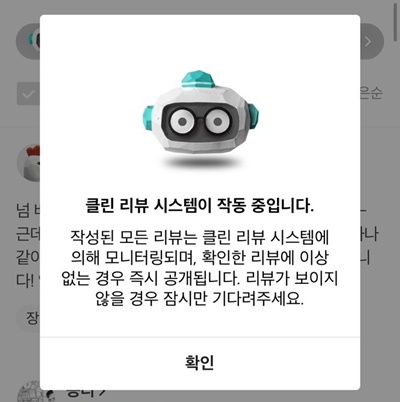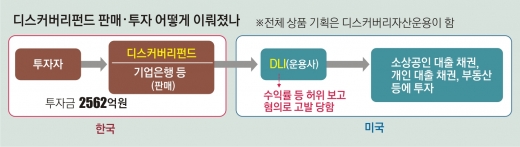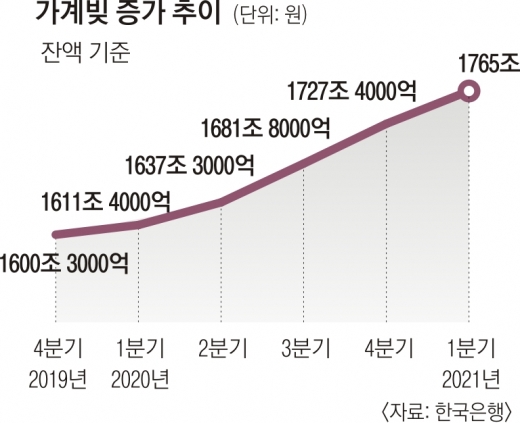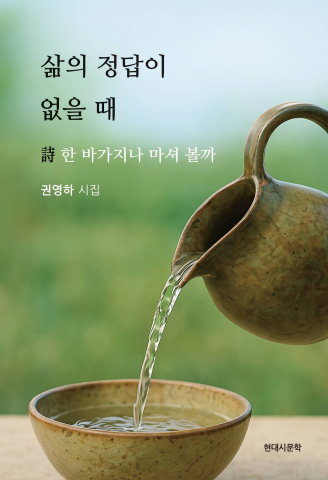3일 방송되는 KBS '동네 한바퀴' 제351회에서는 서울 성동구 편이 그려진다.
▶ 튀르키예에서 온 자매의 달콤한 도전
여기가 공장 거리였단 걸 누가 알 수 있을까. 70~80년대엔 제화, 인쇄, 염색 등 공장들이 모여있던 곳. 아직도 그때의 이름을 간직한 붉은 벽돌엔 이제 그윽한 커피 향이 배어나고 있다. 하루 1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서울에서 제일가는 핫플레이스가 된 성수동 카페 거리. 상전벽해한 이곳을 구경하던 이만기의 발걸음을 잡은 이들이 있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와 시식을 권유하는 이국적인 두 사람, 퀴브라 세벤임과 아이쉐 정 자매다. 두 자매는 튀르키예에서 왔으면서도 천하장사를 알아봐 이만기를 놀라게 하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다 한국 남자와 결혼했단다. 그 인연으로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날아와 직접 만든 고향의 디저트로 성수동에 도전장을 내민 두 자매. 튀르키예 궁중에서 먹었다는 귀한 디저트의 맛은 과연 어떨까?
▶ 한글도 모르던 소년은 수제화 명장이 되었다.
11살의 한용흠 씨는 책가방 대신 구두 망치를 들었다. 사업이 망해 좌절한 아버지와 학교에 보낼 남동생이 있었기에 용흠 씨는 고사리손으로 못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그렇게 50년, 손엔 굳은살이 가득해졌고 그동안 만든 신발은 수만 켤레가 넘었다. 그 수제화를 신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멋지게 춤을 췄고 누군가는 발에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세상을 누볐다. 그 실력에 영국에서 유학하던 청년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게 한글도 못 쓰던 소년은 이제 명장이라 불리게 됐다. 하지만 그 명성보다도 발이 편안하다는 손님의 말이 더 행복하다는 용흠 씨. 오늘도 그의 공방엔 망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 청춘에게 위로를 건네다, 일본식 청어 메밀국수
어두운 새벽, 성수동 카페 거리의 골목. 반지하 아래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메밀가루를 반죽하는 김철주 씨를 만난다. 가루에 물을 먹여 동그란 반죽으로 만들고 밀대로 쭉 밀어 네모나게 편 반죽을 접어 일정하게 썬다. '써는 데 3일, 펴는데 3개월, 가루에 물 먹이는데 3년을 배운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일본 전통 메밀면을 익히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철주 씨는 일본 전역을 돌며 명인을 만나 메밀국수를 배웠다. 빈털터리 유학생이었던 철주 씨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온메밀국수 한 그릇이 떠올라서였다. 35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철주 씨는 이젠 성수동 청년들에게 메밀국수를 대접해주고 있다. 새벽부터 반죽한 메밀면에 청어 조림을 곁들인 청어 메밀국수. 그 속엔 35년 전 청년 김철주에게 건네는 위로가 담겨있다.
▶ 사라질 추억을 붙잡는 골목 화가
우리가 두고 온 추억이 그곳에 있다.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 친구들끼리 모여 재잘재잘 떠들 때면 공원이 되었고 축구공을 가져와 찰 때면 운동장이 되어주었다. 이제는 재개발로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들. 10년 전부터 화가 윤정열 씨는 펜과 붓을 들고 서울의 사라지는 골목들을 스케치북 속에 담았다. 어릴 적 종로 골목에서 뛰어놀던 정열 씨가 커가며 잊고 지냈던 것들이었다. 30년간 건축 설계사로서 새롭고 멋들어진 건물들을 만들어왔던 그는 왜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이제는 책상을 벗어나 골목 사이를 누비는 정열 씨.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화폭 속에 담았을까?
▶ 장안평 중고차 시장 터줏대감의 엄마 밥상
각박한 도시에서 힘들 때면 그리운 이름, 엄마. 그럴 때면 장안평 중고차 시장의 사람들은 지하상가에 내려간다. 오래된 복도를 지나 식당 문을 열면 6명의 엄마들이 반겨주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 80대의 어머님들이 잔칫날처럼 모여 쪽파 썰고 나물 다듬고 하느라 분주한데. 마지막으로 팔순의 주인장 정주선 씨가 대야에 합쳐 조물조물하면 반찬들이 금세 뚝딱뚝딱 만들어진다. 양념은 소금, 참기름, 마늘, 참깨 한 줌이면 된다. 여기에 아침에 장 봐온 생물 낙지를 볶아 상에 올리면 식사 준비 끝이다. 별거 안 했는데도 맛깔나기로 유명한 주선 씨의 낙지볶음 한 상.
그래서 점심때면 주선 씨를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이 꽉 찬다. 이 손맛 덕분에 주선 씨는 38살에 남편을 떠내 보내고도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다. 지금은 식당 일을 도울 정도로 장성한 큰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선 씨는 자신이 못나서 딸을 고생시키는 것만 같다.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이 커도 더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손님들이 주선 씨의 밥상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