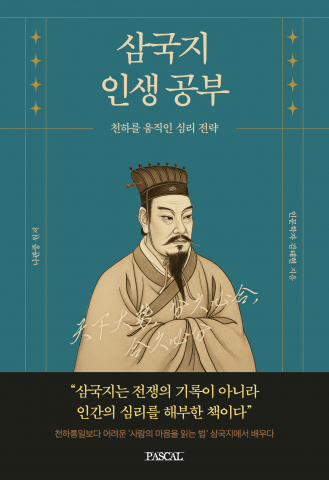(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고(故) 현승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교직 사회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허무 속에서 질문을 반복해왔다.
“왜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는가.”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교원과 학부모 단체 6곳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달라. 그 한마디에는,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교육 시스템의 냉혹한 단면이 담겨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교육청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육청은 “조사 결과가 엇갈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의 조사는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절차이고, 교육청의 조사는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둘은 목적이 다르다. 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핑계로 자체 조사를 미루는 것은, 행정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조사위원 일부가 인사이동된 사실도 신뢰를 무너뜨렸다.
단체들은 “조사가 한창인데 담당자를 바꾼 건 사건을 가볍게 본 증거”라고 지적한다.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인사”라고 해명하지만, 이 사건에서 필요한 건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였다.
이번 사건은 행정의 무관심이 교사를 어떻게 고립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제주도교육청의 ‘통합민원팀’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 했지만, 정작 그 팀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다.
고인은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렸고, 사망 전날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학교도, 교육청도 움직이지 않았다.
유가족과 교원단체의 말처럼 “제도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현재 통합민원팀을 보강 중이며,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야 작동하는 제도라면, 그것은 ‘보호 체계’가 아니라 사후 보고 체계일 뿐이다.
김광수 교육감의 “말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발언이 유가족은 물론 교원들에게 너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7월 방송 대담에서 “선생님이 힘든 걸 이야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고통을 알리지 못한 탓이 아니라, 들어줄 시스템이 없었던 탓이다.
제주교육청은 “교원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 말은 현실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행정이 고인을 이해하지 못한 자리에서, 신뢰는 무너졌다. 그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제도보다 먼저 공감이 회복돼야 한다.
교육청은 이제라도 진상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책임을 덮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행정의 말단이 아니다. 아이들의 앞에 서는 사람이고, 교육의 가장 앞줄에서 사회의 온도를 느끼는 존재다.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시스템이라면, 그 사회의 교육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교육은 사람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 일에서 행정은 사람을 놓쳤다. 우리는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행정의 차가운 보고서보다, 사람의 목소리와 진심이 먼저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누군가의 이름이 ‘교권의 희생자’로 남지 않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