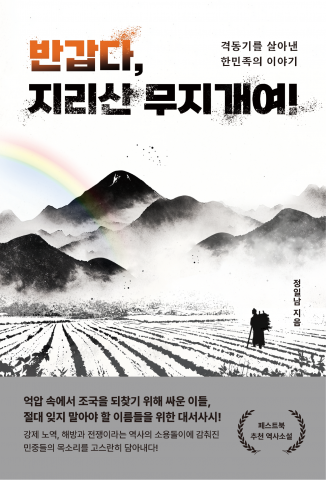7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은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하다, 닭 한 마리의 온기" 편으로 꾸며진다.
배고팠던 시절, 서민들의 배를 채워줬던 닭 한 마리
'닭'이라는 단순한 식재료에는 과거의 ‘특별한 날 잡았던 씨암탉’부터 현재의 ‘배달 치킨’까지의 다양한 배경이 묻어있다. 발전하는 한국 사회와 함께 변화한 닭의 변천사
그 오랜 세월의 맛을 만나러 가보자.
‘치킨 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닭의 요리는 기름에 튀겨지는 노릇한 치킨이다. 그렇다면 치킨이 탄생하기 전 한국인들은 어떻게 닭을 조리해 먹었을까?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로 이름을 날렸던 닭은 지역별로, 세대별로 그 배경에 따라 다른 맛을 냈다. 1960년대 초에는 ‘사위에게 씨암탉 잡아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양계산업과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다른 고기에 비해 구하기 쉽고 조리하기 편한 닭고기를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 주머니가 가벼웠던 이들에게 닭고기의 외식문화가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함께 발전한 닭의 변천사. 치열했던 시대 속에 담겨 있는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 닭 한 마리로 내는 다양한 맛! –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토종닭 한 마리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해남의 닭 요리 촌. 이곳은 국가에서 허락한 닭요리 특화 마을로 갓 도축한 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인 해남의 닭 요리 촌은 무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80년대, 닭이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던 시기 전국적으로 닭의 외식 문화도 발전되기 시작했다. 해남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의 개통으로 외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기회를 통해 닭 코스 요리가 생겨났다.
해남의 닭 요리 촌의 역사는 생닭을 팔던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뒷마당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 줬었던 1대 사장님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담백한 백숙으로 내놓았고 2대 사장님인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닭 주물럭을 개발해 가짓수를 늘렸고 3대 사장님인 안덕준 씨(53세) 역시 가업을 잇기 위해 전기 통닭에서 착안한 닭구이를 개발했다고 한다. 무려 3대에 걸쳐 탄생한 닭 코스요리. 닭회, 닭 주물럭, 닭구이, 백숙, 닭죽, 닭똥집 볶음까지 한 마리의 닭으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맛으로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그 이후 해남 일대에는 닭 요리 집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지금의 닭 요리 촌이 형성되었다. 음식을 넘어 문화를 만든 해남의 닭 코스 요리를 찾아간다.
■ 고단한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건낸 ‘닭내장탕’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는 70년대 고단한 노동자의 배를 채워주던 음식, 닭 내장탕이 있다. 인근에 있던 청량리시장 ‘닭전’에서 구할 수 있었던 닭. 하지만 생각보다 값비쌌던 살코기에 노동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었던 닭 내장을 찾았다. 지난 60여 년의 긴 역사 동안 끓은 왕십리의 닭 내장탕은 지친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됐는데 신선한 닭 내장인 닭알, 근위, 알집과 내장 고유의 맛을 헤치지 않도록 유일하게 넣은 채소인 무. 그리고 비법 양념에 끓인 닭 내장탕이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하루 보상으로 충분했다.
‘닭 내장탕’에는 50여 년 전 무일푼으로 장사를 하게 된 어머니의 인생 배경이 담겨있다. 가장 투박한 재료로 특별한 맛을 자아내는 왕십리 닭 내장탕. 그 한 그릇에 담긴 긴 세월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 그 시절, 모두를 배불렸던 ‘닭똥집 튀김’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닭의 성지’ 라고도 불리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그중에서도 평화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 닭전시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대구 평화시장 일대는 닭의 부속물인 닭의 모래주머니를 튀긴 ‘닭똥집튀김’이 등장하며 닭똥집 골목이 형성됐다. 반 세기 간 많은 대구 시민의 사랑 받은 ‘닭똥집 골목’. 그래서 인지 대구 사람들에게 ‘닭똥집 튀김’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인력시장에서 일을 끝내고 저녁에 오는 사람들은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하기 위해,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찾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대구 닭 역사의 시초이기도 한 닭똥집 골목. 평화시장 상인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올해로 51년째 치킨 무를 써는 할머니부터 한 자리에서 30년이 넘도록 닭똥집을 튀긴 남매 박용준 씨 (70세), 박영화 씨 (65세)까지 그야말로 반평생을 닭똥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값싼 재료지만 대구 시민 모두를 배불렸던 닭똥집 튀김. 그 뜨거웠던 시절의 열기를 느껴본다.
■ 물닭갈비보다 뜨겁게 끓었던 광부들의 삶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중심지. 강원도 도계에는 광산에서 쓰는 ‘끌차’라는 뜻의 ‘삭도마을’이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광부거나 광부의 가족인 삭도마을.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는 빼곡히 붙어있는 광부들의 사택부터 아직 타오르고 있는 연탄, 광부 남편을 생각하며 만든 아낙들의 마음이 담긴 음식까지 곳곳에 삶의 때가 묻어 있다.
좁고 어두운 곳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에겐 모든 일이 고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갈증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들이 퇴근 후 가장 먼저 찾았던 건 목을 축일 수 있는 막걸리 한 사발과 석탄으로 인해 칼칼해진 광부들의 목을 씻겨주던 ‘물닭갈비’였다. 항상 위험 속에서 광산을 캤던 광부들. 그들이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물닭갈비는 서로의 안녕을 빌며 먹었던 위안의 음식이었다. 그리고 광부 남편들만큼이나 함께 마음 졸이며 아내들은 남편의 무사를 빌며 애타는 마음으로 닭죽을 끓였다. 섭씨 30℃가 넘게 들끓는 갱도에서 나와 먹었던 닭 한 마리. 광부들에게 닭 한 마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안도 그 자체였다. 수천 미터의 지하 탄광 아래에서 땀을 흘린 광부들의 삶. 물닭갈비보다 뜨겁게 끓었던 광부들의 인생을 들여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