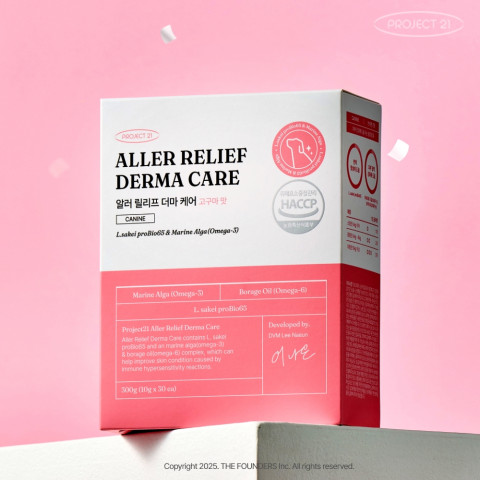[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국을 뒤덮은 쓰레기산과 쓰레기밭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이 5년간의 추적 끝에 밝힌 결론은 충격적이다. 겉보기엔 '재활용', 실상은 ‘쓰레기 떠넘기기’가 낳은 병폐였다.
2019년 경북 의성에서 발견된 ‘쓰레기산’은 전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다. 당시 적발된 방치량은 3만2000 톤. 처리에는 1년 7개월과 94억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공제조합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로도 전국에 쓰레기산 493개, 쓰레기밭 107개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조합은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한 업체 부실이 아닌, 한국 재활용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심은 **2016년부터 시행된 ‘재활용 네거티브 규제’**다. 정부는 재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했고, 이에 따라 현재 41개 물질에 대해 무려 1,802개의 재활용 방법이 인정된다. 재활용업체도 2023년 기준 7,221곳에 달한다.
문제는 대다수 폐기물이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상 ‘재활용’으로 분류되기만 하면 배출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재활용률 인정, ESG 경영 실적 확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폐기물을 재활용 형태로 배출하려 하고, 재활용업체는 수익을 위해 이를 무조건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은 곧 ‘처리 불능 폐기물’의 재활용 포장 → 재활용업체 과부하 → 폐기물 방치 → 쓰레기산·쓰레기밭 양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는다. 공제조합은 이 현상을 ‘재활용률 인정 제도의 병목’이라 규정했다.

재활용률 중심 정책의 역설
공제조합 측은 "재활용률을 재활용업체 경유 여부로만 판단하는 현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각장으로 바로 폐기물을 보내면 제도상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자들은 불가피하게 재활용업체를 ‘경유지’로 삼는다. 소각이 불가피한 폐기물까지도 재활용 형태로 이동하면서, 재활용업체는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결국 처리 불능 폐기물이 산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소각장의 재활용시설 인정이다. 일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열회수 효율을 갖춘 소각장을 재활용시설로 분류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자원순환의 일부로 간주한다. 공제조합은 “소각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면 배출자는 부담 없이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 실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각업계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다수의 소각업체는 소각장의 재활용 의무 부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너지 회수율이 높은 현대식 소각장은 이미 일정 수준의 ‘재활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재활용-소각은 대립 아닌 보완 구조”
전문가들도 재활용과 소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천승규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폐기물은 성격상 ‘처리’의 개념을 전제로 해야 하며, 에너지 회수와 재활용은 상호 보완적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도 “ESG나 순환경제가 강조되는 지금, 모든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유해성분이나 분리불능 폐기물 등은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소각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재 소각장에서 회수되는 열에너지가 상당한 만큼, 소각열 회수율에 따라 재활용률을 인정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목구조 해소 위한 법 개정 필요
공제조합 김형순 이사장은 “이제 쓰레기산, 쓰레기밭 발생 원인이 규명된 만큼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흐를 수 있도록 단순 소각을 하지 않고 100%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소각장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배출자들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폐기물에서도 ESG 실적과 재활용률 인정 등이 함께 부여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쓰레기산, 쓰레기밭 발생 원인을 지적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의 병목현상이 빚어낸 쓰레기산, 쓰레기밭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법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