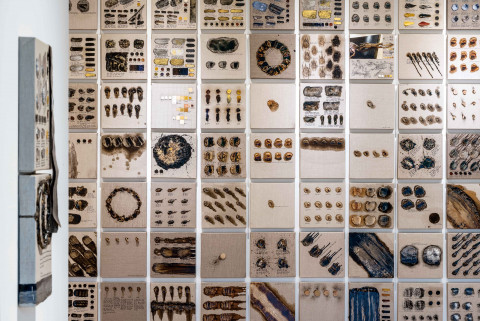[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자원 무기화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광물 비축 확대’ 정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8차례의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핵심 광물의 비축 일수는 대부분 늘지 않아, 자원 안보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지정학적 갈등과 수출 통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례가 총 8차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광물 비축 확대 계획’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비축 확대를 추진 중이라 밝힌 13종의 핵심 광물 중 9종은 비축 일수가 단 하루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10종은 여전히 60일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비축 예산이 연 단위로 편성돼 장기계약이 불가능하고,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스팟(Spot) 구매 방식만 허용돼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해광업공단 또한 “다년 계약이 불가능해 매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단기 구매 방식은 안정적 공급 확보에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축 확대’ 공언이 실질적 실행력 없이 ‘말뿐인 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JOGMEC(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형 장기공급 계약과 해외 지분투자 모델을 병행하며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상사기업 소지츠(Sojitz)를 통해 호주 라이너스(Lynas)에 투자, 서호주 마운트 웰트 광산의 디스프로슘·터븀 생산량 최대 65%를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중희토류 수요의 약 30%를 자체 확보했다. 올해 3월에도 프랑스 카르마그(Caremag)에 1억1천만 유로를 출자, 희토류 재활용 제품의 절반을 일본에 장기 공급받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터븀 등 주요 희토류 원소와 중국 기술이 사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수출 허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는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반도체, 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공급망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 광물 비축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방안보 차원의 미비축 광종 지정, △정광(原鉱) 비축 및 관련 산업 육성, △민·관 협력형 장기계약과 해외 지분투자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물 비축 관련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의 통합 운영을 신속히 마무리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