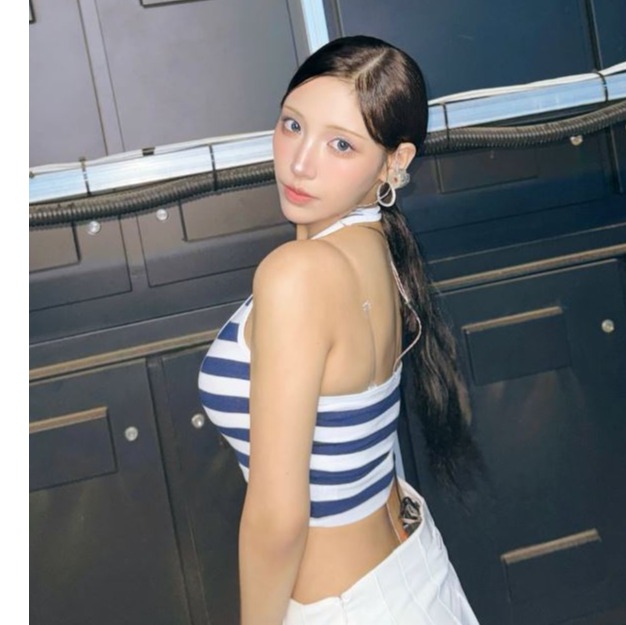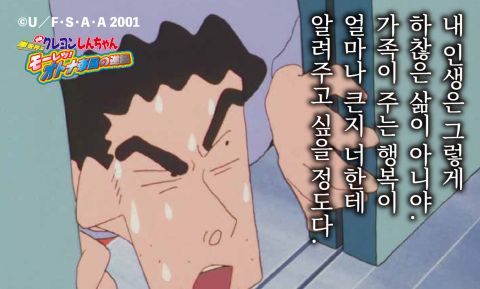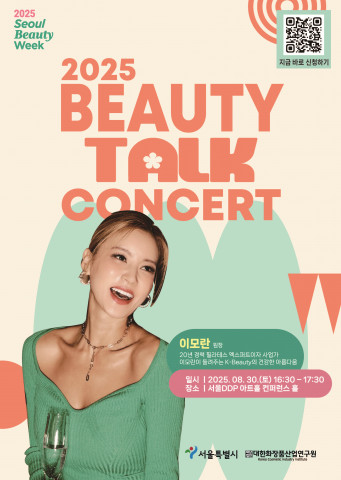◆ 궁중 문서의 발견
2016년 3월, ㈜코베이옥션의 ‘삶의 흔적’ 경매전에 이례적인 자료 한 점이 출품되었다. 바로 조선시대 ‘사옹원(司饔院)’에서 ‘생것방(生物房)’으로 내려보낸 궁중 물목(物目) 두루마리였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대략 18~19세기경 사옹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작가를 훌쩍 넘어 600만 원에 낙찰된 이 자료는, ㈜코베이옥션 26년 경매 역사에서 단 한 번 모습을 드러낸 희귀 문서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의 공식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 기관에 소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궁중 음식의 재료와 조달 과정을 보여주는 실물이 공개된 것은 드물었기에 학계와 수장가의 이목을 동시에 끌었다.
◆ 사옹원과 생것방
‘사옹원’은 임금의 식사와 대궐의 음식을 총괄하던 관청이었다. ‘주방을 맡는 곳’이라는 뜻에서 ‘주원(廚院)’이라 부르기도 했다. 사옹원은 전국에서 진상되는 식재료를 관리하고, 왕실의 일상식과 잔치 음식, 궁궐 밖 행차 시의 끼니, 심지어 궁중을 드나드는 관원들의 식사까지도 맡았다.

사옹원의 체제는 1467년(세조 13)에 확립되었는데, 《경국대전》에 직제와 업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사옹원의 총책임자는 정1품 도제조(都提調)였고, 제조·부제조와 같은 관리직은 종친이나 고위 관료가 겸임하며 왕실의 밥상을 철저히 살폈다.
‘진상’은 지방의 특산물을 궁중에 올리는 제도였는데, 그중에서도 임금의 식사에 쓸 재료를 바치는 것을 ‘물선진상(物膳進上)’이라 했다. 각 도에서 모인 진상은 관찰사와 병마·수군절제사가 총괄하여 육로와 수로를 통해 운송되었으며, 대체로 한 달에 1~2회,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뤄졌다. 사옹원은 이 중 가장 신선한 것만을 엄격히 선별해 궁중 부엌으로 보냈다.
궁궐의 부엌은 ‘수라간(水刺間)’, ‘소주방(燒廚房)’, ‘생과방(生果房)’ 등으로 나뉘었다. ‘수라’는 임금의 식사를 높여 부르는 왕실 용어로, 수라간은 상을 차리는 곳이었고 실제 조리는 소주방이 담당했다. 소주방은 다시 내소주방과 외소주방으로 나뉘어, 전자는 일상식을, 후자는 잔치나 제례 음식을 주로 맡았다.
‘생것방’·‘생물방(生物房)’으로도 불린 생과방은 별식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디저트’를 담당하는 부엌에 해당했다. 생과방에서는 다식·과일·차·화채·죽 등을 마련해 왕실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다.

◆ 궁중 음식을 만든 사람들
실제 요리를 담당한 사람들은 ‘숙수(熟手)’였다.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맡은 숙수의 일은 육체적으로 고되었기에 대부분 남성이었다. 도망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기록에 남아 있어 그들의 삶이 전혀 평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내시 역시 음식 준비와 검수를 맡았다. 내시부의 최고 관직인 상선(尙膳)은 전국에서 올라온 식재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조리된 음식을 점검하며 임금의 건강을 보좌했다. 내시가 음식 준비와 검수를 맡은 한편, 일상식은 주방 상궁과 나인이 맡았다. 왕실의 부엌은 남성과 여성의 조리 인력이 함께 협력하는 공간이었다.

◆ 물목이 전하는 이야기
경매에 낙찰된 ‘사옹원’ 물목 두루마리에는 ‘녹말, 총화(蔥花), 흑임자, 백임자, 청태, 황귤, 생강, 오미자, 황청, 백청, 전복, 해삼, 홍합, 문어, 오징어, 황포(黃脯), 백대구, 강대구’ 등 후식과 별식을 위한 재료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물목은 고급 한지에 정갈히 쓰였으며, 재료는 곡물·과일·해산물 순으로 배열되어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체계적 형식을 보여준다. 궁체는 단지 미려한 글씨가 아니라, 왕실 문서가 지녀야 할 권위와 단아함을 드러낸다. 이처럼 물목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궁중 음식 문화를 떠받친 운영 체계와 기록 방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가로 170cm, 세로 29.2cm에 이르는 대형 문서임에도 보존 상태가 뛰어나, 임금의 밥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 궁중 음식 문화가 남긴 울림
‘사옹원’에서 ‘생것방’으로 내려보낸 물목 두루마리는 그저 식재료를 나열한 명세서가 아니다. 그것은 임금의 건강과 권위를 떠받치던 궁중 음식 문화의 정밀한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며, 공경과 나눔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다.

궁중 음식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정치적 행위이자 국가적 상징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정성 어린 재료는 임금의 상으로 올라왔고, 임금은 그 밥상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가늠했다. 흉년에는 반찬 수를 줄여 백성과 고통을 나누었고, 경사에는 풍성한 잔치 음식을 베풀며 기쁨을 함께했다. 제사 음식에는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았으며, 귀한 음식을 신하와 군사, 노인들에게 하사하여 위로와 은혜를 전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음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존엄과 공동체적 연대를 상징한다. 과거 임금의 수라상에 깃든 정신은 곡식과 해산물을 길러 올린 농민·어민·산촌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땀방울이었고, 음식을 빚고 차린 숙수와 내관·상궁의 정성이었으며, 오늘날 가정의 밥상을 지켜온 할머니·어머니·아내의 손길이기도 하다. 그 속에는 맛을 내기 위한 세심한 노력과 먹는 이에게 기쁨과 품격을 전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정신은 지금 우리의 밥상에서도 조용히 숨 쉬고 있으며, 그것이 궁중 음식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