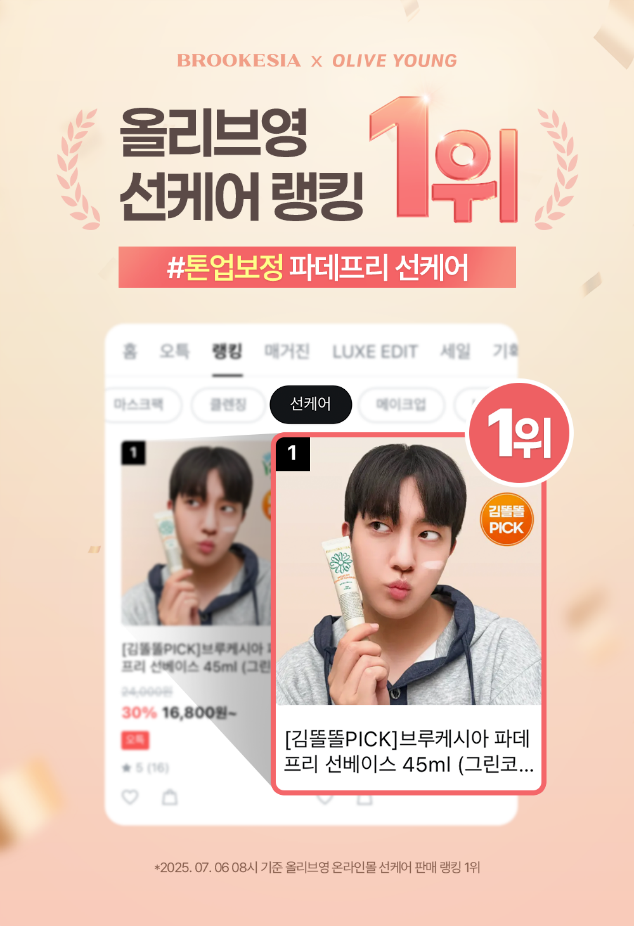오대산 아래 작은 들판. 거기엔 밥 짓는 연기가 낮게 피어올랐다.
그 땅에서 농민 권린교(權獜敎)는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조용한 절집 월정사 근처, 임금이 직접 내려준 사패지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 가운데 일부를 절에 세금처럼 바쳐 왔다. 10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평화로운 관행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어느 해 겨울, 그 균형이 깨졌다.
절집 스님들이 세금 계산법을 바꾼 것이다. 이전엔 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양을 냈지만, 이제는 논의 넓이를 기준으로 고정된 양을 내라는 방식, 이른바 “도지법(賭地法)”을 들이댔다. 가뭄이 들든, 수확이 적든 상관없었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다.
권린교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글을 썼다. 아니, 거의 울부짖다시피 써 내려갔다. “식솔을 거느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 땅에서 계속 농사짓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진정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담은 기록이다.
왕이 내려준 사패지, 그 위에서 수세법이 도지법으로 바뀌는 순간, 절은 권력을 행사했고, 권린교는 밥줄을 잃었다. 절집의 스님들조차 영역 내 소작료 체계를 바꾸며 그들만의 ‘제도’를 만들어냈고, 백성은 거기에 쓰러졌다.
놀라운 것은, 이 상서문이 실재하는 종이 위에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가로 57.5cm, 세로 50.5cm 크기의 한지 위에 쓴 글씨는 단정한 해서체다. 글 말미에는 관인(官印) 도장과 함께, 당시 관리가 쓴 처리 결과가 초서로 적혀 있다. 다행히도 관리들은 이 호소에 “실정을 살펴 조처하라!”라는 답을 내렸다.

◆ 소작료라는 이름의 무게
이 사건은 단순히 절집과 농민의 갈등이 아니다. 조선 후기에 지대 수취 방식이 소작농의 삶을 어떻게 옥죄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다.
원래 농민들이 따르던 수세법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바치는 “병작법(並作法)”의 일종이었다. 풍년이면 더 내고, 흉년이면 덜 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땅 면적 기준의 “도지법(賭地法)”으로 바꾼 것이다. 마치 장부의 공식이 달라지자, 사람들의 삶이 지워진 셈이다.
‘도지법’은 근대 이전에는 드물게 사용된 방식이며, 지역에 따라 ‘도조법’, ‘도작법’으로도 불렸다. 이 방식은 결국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정조법(定租法)’으로 이어진다. 이 법의 공통점은 하나다.
땅을 가진 자가 위험을 피해 가고, 땅을 빌려 쓰는 자가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
◆ 종이 위에 남은 목소리
권린교의 이름은 오늘날 어떤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다. 그는 오직 한 장의 종이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 한 장은 19세기 조선의 백성이 어떤 현실을 살았는지, 그 현실과 싸우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이었는지를 또렷하게 증언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서를 “고문서”라고 부른다. 그러나 때로 고문서는 역사의 먼지가 아니라, 사람이 남긴 가장 절실한 언어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언어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를 똑바로 바라본다.
“제발, 계속 농사짓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