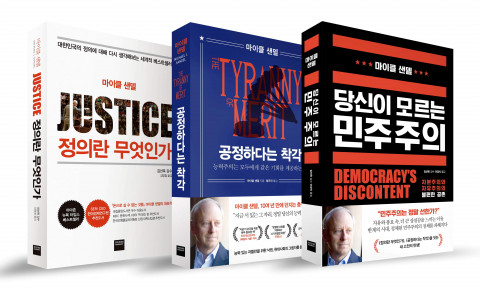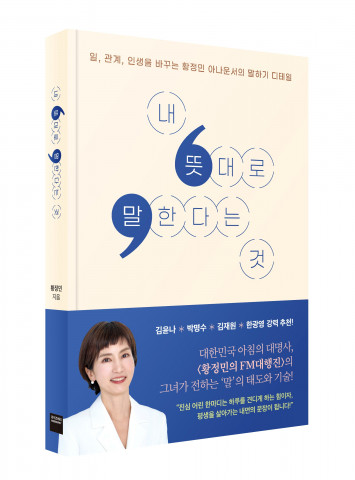문제는 한국의 기후재정 관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재정 세미나에서 여야 의원과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현재 기후재정은 각종 계획이 제각각 흩어져 있어 총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 수입은 가격 하락으로 건전성을 잃었고, 정부가 약속한 5년 90조원 확보 계획도 실제 달성률은 70%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기본적인 민생 피해 보전조차 힘들 수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배출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전력 부문 배출권을 단계적으로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해 오염 비용을 제대로 부담시켜야 한다. 여기에 현재 연간 약 13조원 규모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2030년까지 줄이면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전환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정의로운 부담 분담이며, 재정 건전성과 전환의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조달 수단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 계획에 맞춰 예측 가능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려면 투명한 인증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또한 채무 관리와 함께 전환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택소노미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탄소세와 전기요금 인상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탄소배당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물가 충격을 완화하고, 건물 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검증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
기후재정의 뒷받침은 결국 정부만으로는 어렵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와 세제 혜택이 병행돼야 하며, 이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로 이해돼야 한다.
지금 빚을 내서라도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2100년 GDP의 20%가 사라질 수 있는 기후재난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금을 쌓아 미래 충격을 완화할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국민 다수도 강력한 감축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후재정을 ‘민생 재정’으로 규정하고 투명하고 충분한 재원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적 책무이자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