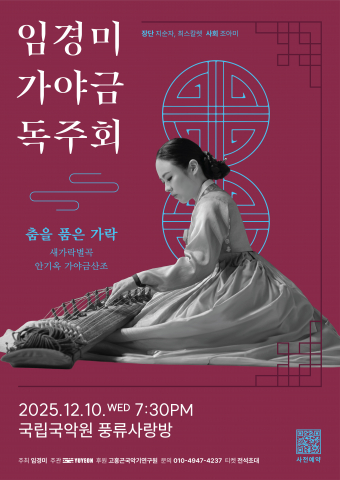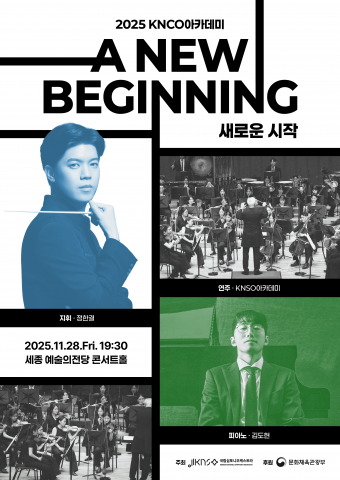랭킹 뉴스
-
- 4[mhn포토] 황유민, 미니스커트는 처음이에요
- MHN스포츠
많이 본 뉴스
-

- 2 병무청, 대학진학 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 코리아이글뉴스
-

- 3 우상호 수석 "제1부속실장 출석 거부 과하다"
- 국제뉴스
-

- 4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제뉴스
-

- 6 금천구시설관리공단 ‘RE:CYCLE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 뉴스와이어
-

- 8 천하람 "헌법 파괴 행위 야당 힘 합쳐 싸워야"
- 국제뉴스
-

- 10 윤종오, "장동혁표 극우의힘 철저히 외면당할 것"
-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