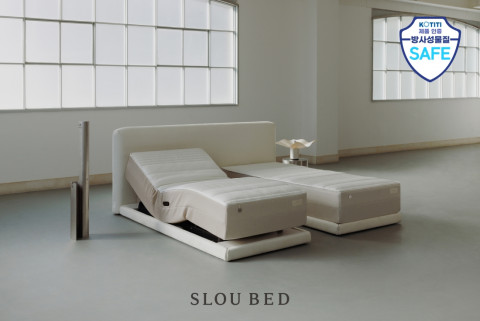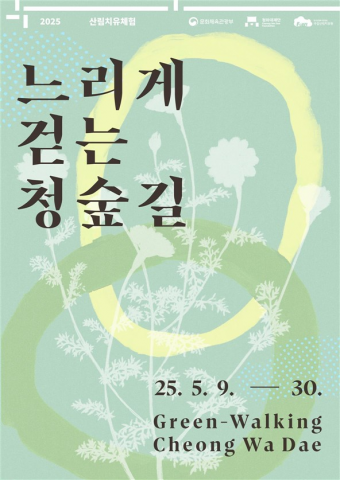Q. 이수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술과 건축, 공간과 삶의 균형을 감각적으로 기획해 온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미술 기획자이자 기업의 대표, 그리고 일상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표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A. 반갑습니다. 저는 ‘감각은 나를 조율하고, 균형은 나를 지킨다.’는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싶어요. 공공미술 기획자로서 공간과 사람, 예술과 도시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삶의 태도도 조금 더 유연하게,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소유보다 여운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를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는지가 결국 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기에 일과 루틴, 감정의 균형을 ‘기획하듯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과 공간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나 여운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기쁜 성과입니다.
Q. 대표님께서는 석·박사 과정에서 예술과 기업의 관계를 꾸준히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의 감각적 기획과 사회공헌적 실천으로 이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저에게 학문은 단지 지식을 쌓는다기보다 생각의 뿌리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논문을 쓰며 단순한 후원이 아닌, 예술을 기업의 철학과 책임의 언어로 다루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까르띠에와 에르메스라는 두 브랜드가 예술과의 관계를 일회성 지원이나 마케팅 수단이 아닌, ‘브랜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들의 메세나 활동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품격 있었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도아트컴퍼니를 운영하며 공공미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가 방향이 되었고, 예술을 통해 공간과 도시, 그리고 사람의 감각에 이야기를 더하는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기업인으로서, 단순한 자본의 순환이 아닌 ‘가치의 흐름’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Q. 오~ 까르띠에와 에르메스를 중심으로 연구하셨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혹시 그 논문 주제는 대표님의 명품 취향에서 시작된 건가요? 까르띠에와 에르메스는 모든 여성의 최애 브랜드죠!
A. 그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제품을 넘어 ‘시간과 감각, 장인정신에 대한 철학’을 지켜온 방식, 그리고 예술과의 관계를 ‘의무’가 아닌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브랜드가 예술을 후원하며 전시에 로고를 얹는 마케팅이 아니라 예술과 공존하고 작가와 호흡하며, 시대와 감각을 함께 빚어낸다는 점은 기업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품격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내내 늘 흥미로웠고, 오히려 예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전 박사진학을 준비하면서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꽤 오래 방황했는데요, 제 존경하는 인물 top 3에 계신 유재길 지도교수님께서 그런 저를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너무 가볍게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까르띠에, 이수완 아니면 누가 소통하겠어~” 그때 그 가벼운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었어요. 교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를 무게 없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건네는 분이세요. 그 덕분에 저는 고민하던 시간의 반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죠. 또 논문을 즐겁게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까르띠에의 전설, 너무 멋진 김은수 상무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유재길 교수님의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실제로 대표님의 실천과 기획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길을 구체적으로 걷게 된 배경이 있었을까요?
A. (갤러리 운영 경험 기반으로 강의 시작) 논문 발표 후, 교수님께서 미대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는 “갤러리 운영 경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현장을 학생들과 나눠보세요”라며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가 2013년, 갤러리 운영 7년 차쯤이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고,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저를 생각하는 사람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논문에서는 까르띠에와 에르메스를 중심으로 기업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철학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예술을 브랜드 마케팅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하는 과정이었죠. 강의하며 질문은 더 깊어질 즈음 교수님께서 다시 가볍게 건네신 한마디가 "이수완은 공공 미술이 맞아" 였습니다. 그렇게 공간과 예술, 사람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결국 공공미술이라는 실천으로 확장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하나의 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웃음) “이수완은 공공미술이 맞아.”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한 가르침이 되었고 저의 감각과 실천이 향해 가는 방향을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이미 아시고 제가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주시고 출강의 기회까지 주셨던 걸까요?
Q.5 예술을 통해 사회에 응답하는 방식, 그 안에서 기업과 건축주의 역할에 대해 대표님만의 철학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A. (책임 있는 아름다움, 태도에 대한 선언) 공공미술은 그 공간을 스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결을 남기고, 도시의 표정을 감각적으로 바꾸는 방식이기도 하죠. 기업과 건축주야말로 그 변화의 출발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간에 예술을 더하는 선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공간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실천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책임 있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방식,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응답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감각적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미술과 공간기획을 중심으로 예술과 도시 사이의 감각적 연결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도아트컴퍼니는 그 흐름 속에서 공간과 예술, 기업과 도시를 연결하는 예술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