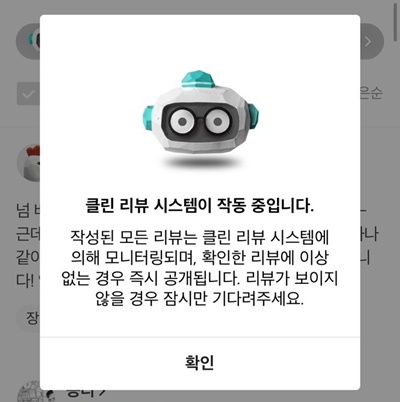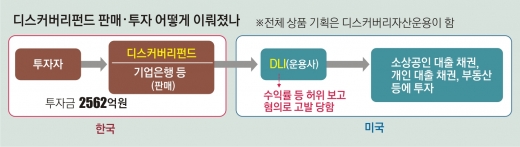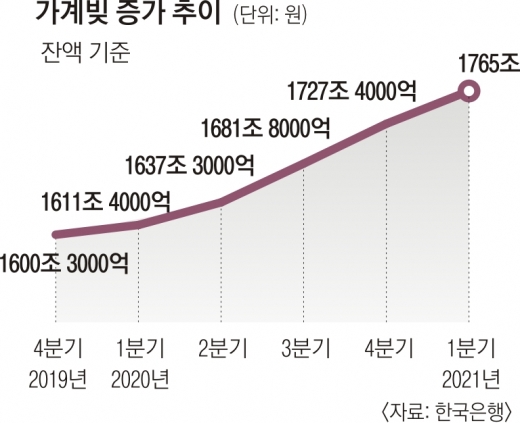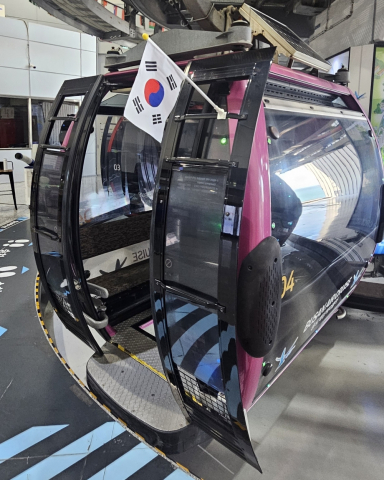벌교를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꼬막을 생각하거나, 조정래 선생의 소설 『태백산맥』을 떠올린다. 하지만 마을을 천천히 거닐다. 보면, 꼬막과 문학 너머에 숨은 벌교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다. 붉은 벽돌 창고와 오래된 일본식 건물, 골목길 위에 남은 아픈 역사, 강 위에 걸린 다리들. 이 도시의 풍경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살아 있는 기억의 공간이다.
벌교라는 이름은 1908년 낙안군이 폐지되고 새롭게 지어진 지역 명칭에서 비롯된다. 이후 1937년에는 벌교읍으로 승격되며 근대적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오늘날 벌교에는 보성군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만 7백여 명이 거주하며, 작은 농어촌 마을에서 출발한 도시가 역사와 사람을 품고 성장해 온 흔적을 보여준다.
1930년 개통된 벌교역은 남해안의 해산물과 농산물이 내륙과 일본으로 향하던 출발점이었다. 일본 헌병대 건물과 적산가옥은 오랜 흔적으로 남아 있지만, 이를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벌교는 단순한 ‘수탈의 현장’이 아니라, 역사를 함께 나누는 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다. 구 일본식 건물은 박물관이나 체험 공간으로, 적산가옥은 카페나 전시관으로 더 확장 재생하면 세대 간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
벌교에는 고려·조선 시대 방어 거점이었던 부용산성과 전동산성도 있다. 산에 걸터앉은 두 성은 외적을 막아내던 든든한 방패였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복원과 정비를 통해 탐방로와 체험 공간으로 만들면 벌교는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역사도시가 된다. 아이들이 성곽길을 걸으며 조상의 지혜와 용기를 상상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산성 이야기를 나눈다면, 벌교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 된다.
벌교의 다리들도 주목할 만하다. 홍교는 예부터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길목이었다. 반면 소화다리는 여순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장소로, 다리를 걷는 발걸음마다 그날의 아픔이 묻어난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억과 성찰을 담은 공간이다.
벌교는 음악의 숨결도 품고 있다. 한국 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채동선 음악가가 이곳에서 태어나 음악적 길을 걸었다. 문학관과 연계해 음악회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관광객은 문학·역사·예술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결되는 관광·문화벨트 전략도 중요하다. 관광객은 갈대숲과 정원을 본 뒤, 벌교로 발길을 옮겨 꼬막을 맛보고, 문학관과 산성, 홍교와 소화다리를 거닐며 채동선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여행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벌교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는 동반자가 된다.
벌교의 매력은 책 속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낡은 건물을 따라 걷고, 산성 길을 오르고, 다리 위에서 강물을 바라보고, 음악과 문학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 도시가 전하는 기억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꼬막의 진한 맛, 태백산맥의 감동, 산성과 다리의 역사적 무게, 음악의 선율까지. 직접 보고, 걷고, 느껴야만 벌교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든다. 세대를 잇는 살아 있는 박물관, 벌교는 바로 그런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