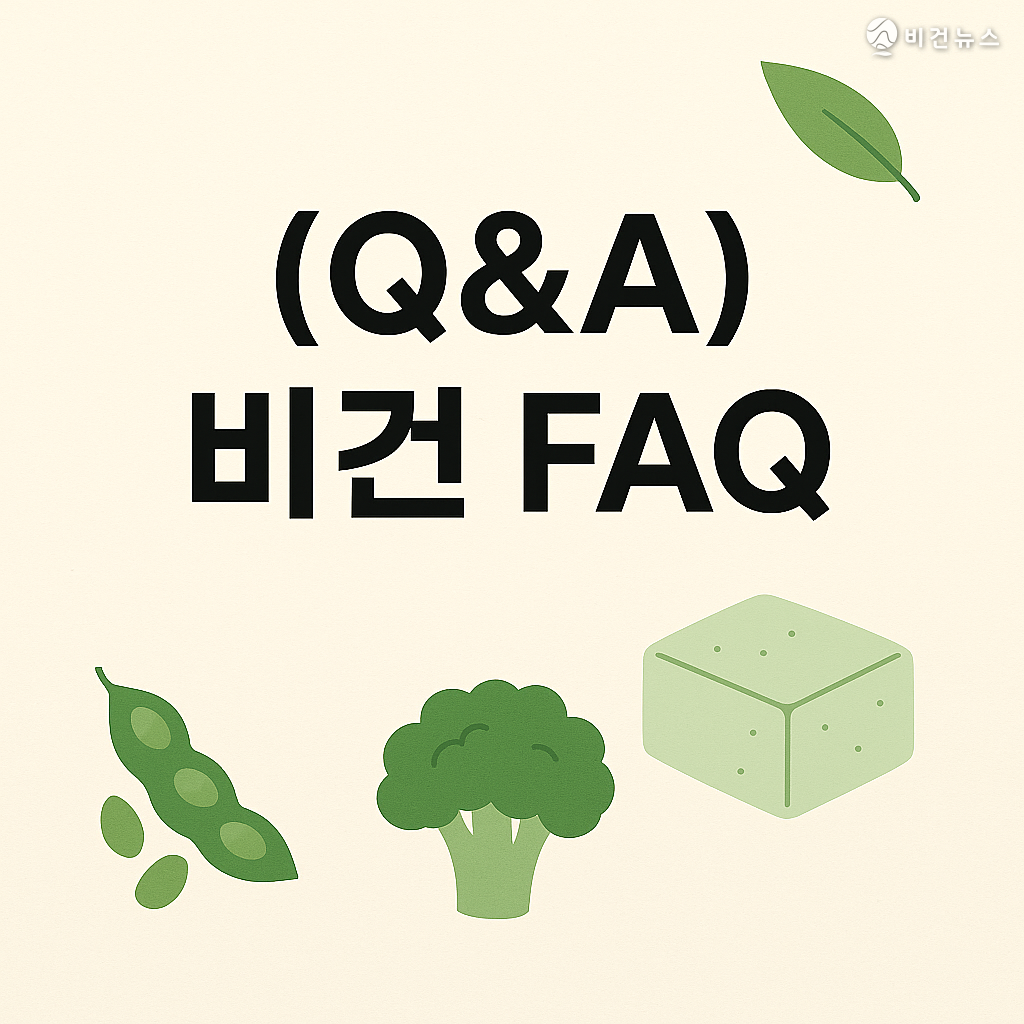[환경일보] “김치에 밥만 있으면 한 끼 충분하다”라는 말처럼, 김치, 젓갈류 등 짭짤한 음식은 한국인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다. 하지만 이들 전통 음식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장에서는 뜻밖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 음식이 만든 기술 장벽
최근 각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를 더 이상 ‘쓰레기’로 보지 않고, 퇴비화·사료화·바이오가스화 등 자원화 하는 친환경 공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바이오가스화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화의 핵심인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염분은 치명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고염도 음식물은 메탄 생성 미생물의 활성을 저해해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고, 공정 전체의 안정성을 흔든다. 나아가 퇴비화·사료화 시 토양 염해와 악취 유발 등 2차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전통 식문화가 친환경 기술과 충돌하며, 새로운 기술적·사회적 과제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혐기성 소화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산소 없이 분해해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이중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1톤을 바이오가스로 처리할 경우 순 메탄 배출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순 배출 저감 효과’도 확인됐다.
이러한 가능성에 발맞춰 정부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3년 ‘바이오가스화 촉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은 2025년부터, 민간기업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했으며, 2034년까지 공공 50%, 민간 10%의 생산 목표도 설정한 상태다.

고염분의 벽: 기술적 한계와 대응 전략
그러나 이 기술이 식탁 위 현실과 맞닿는 순간, 예기치 못한 장벽에 부딪힌다. 문제는 바로 ‘염분’이다. 국내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염분 함량은 혐기성 소화 공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메탄 생성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실험에 따르면 NaCl 농도가 3.5%(35g/L)를 넘을 경우 메탄 생산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고염분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로 헹궈 염도를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술적인 대응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고염분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해양원생생물을 이용한 분해 기술, 내염 미생물 활용, 염도 낮은 유기성 폐기물과의 혼합 처리 등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글리신베타인, 트레할로스같이 미생물의 삼투압 조절을 도와주는 ‘내염제’ 물질을 투입해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하는 전략도 제시된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한국형 고염분 음식물 특성에 최적화된 대응 기술은 아직 개발 및 상용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한 과제
바이오가스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수요처 확보, 고염분 특성에 적합한 공정 설계, 표준화된 전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음식물 분리배출 체계의 정비, 염도 저감형 식품 개발, 소비자 인식 개선과 같은 식문화 차원의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
짭짤한 김치 한 접시가 탄소중립을 향한 기술에 제동을 걸고 있는 지금,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술과 정책, 식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순환경제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식문화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글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김나영 kny011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