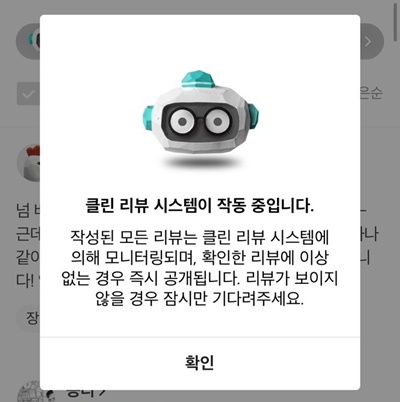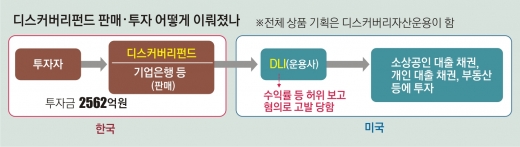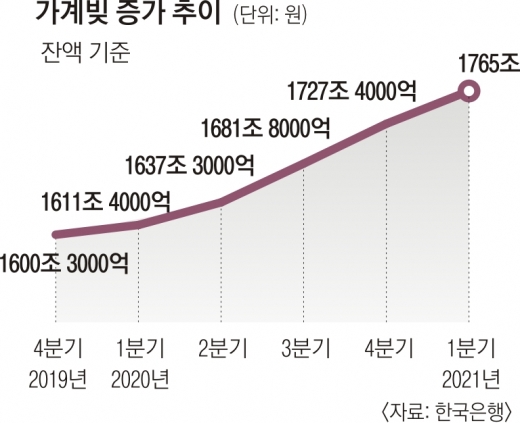(MHN 홍동희 선임기자)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격전을 벌이는 주말 극장가. 그런데 박스오피스 순위표에 낯익은 이름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32년 만에 돌아온 실베스터 스탤론의 '클리프행어', 40주년을 맞아 감독판으로 재상영된 '아마데우스', 그리고 여전히 눈물샘을 자극하는 '인생은 아름다워'까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손을 잡고 봤던 아련한 추억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SNS로만 접했던 '전설'이었을 작품들이 신작 못지않은 열기 속에 스크린을 다시 점령하고 있다. 최근의 재개봉 열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그 힘을 증명한다. 개봉 40주년을 맞은 '아마데우스'는 8일 만에 1만 관객을 넘겼고, 26년 만에 돌아온 '인생은 아름다워'는 개봉 후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지난 2월 재개봉한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은 2008년 첫 개봉 당시의 5배가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6월 25일에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드니 빌뇌브의 '그을린 사랑'이, 7월에는 '시네마천국'과 '델마와 루이스'가 재개봉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신작들의 흥행 실패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가운데, 과거의 명작들은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극장가의 새로운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비수기의 틈새 전략으로 여겨졌던 '재개봉'이 이제는 최성수기인 여름 극장의 한복판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 거대한 '추억 소환'의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빛바랜 추억이고, 누군가에게는 SNS 속 '전설'이었을 이들의 귀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거대한 '추억 소환' 현상은 단순한 복고 유행을 넘어, 지금 시대의 관객과 극장이 보내는 복합적인 신호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세 가지의 뚜렷한 욕망이 교차한다.

첫째, 실패의 공포가 맺어준 '냉정한 동맹'이다.
15,000원에 육박하는 티켓값은 관객의 지갑 이전에 마음의 문부터 닫는다. 이 심리적 마지노선 앞에서, 정체불명의 신작에 '모험'하기보다 이미 재미와 감동이 완벽히 '검증된' 명작에 대한 선호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극장 역시 마찬가지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씨네필'이라는 확실한 코어 타겟을 보유한 재개봉작은 불황기에 기댈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안전자산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관객과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극장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결과다.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아날로그 순례'다.
화려한 CG로 뒤덮인 요즘 영화와 달리, 배우의 표정과 실제 세트의 질감으로 꽉 채워진 아날로그 명작들은 1990년대를 겪어보지 못한 MZ세대에게 오히려 가장 새롭고 힙한 '체험'으로 다가온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이 아닌, 4K 리마스터링된 압도적 화질과 사운드로 전설을 직접 마주하는 행위는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다. "일곱 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봤던 영화"라는 기성세대의 추억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기억으로 대물림되는 '세대 교감'의 현장이 극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온전한 몰입'에 대한 갈망이다.
OTT의 시대, 우리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2배속 재생과 '딴짓'이 일상화된 '스낵 컬처' 속에서, 우리는 서사가 주는 순수한 몰입의 힘을 잃어버렸다. '아마데우스' 수입사 대표의 지적처럼, 잘 만들어진 고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을 스크린 앞으로 끌어당기는 '밀도 높은 힘'을 가졌다. 관객들은 바로 그 잃어버린 감각,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오직 이야기의 힘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그 순수한 경험을 찾아 기꺼이 극장으로 향한다.

물론 이 재개봉 열풍은 세대를 잇는 문화적 가교이자, 시대를 초월한 명작의 가치를 재확인시킨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우리 영화계의 현실을 비추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 재개봉이 극장가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객을 전율시킬 만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 방증일 수 있다.
결국 관객이 극장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볼 만한 영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재개봉 열풍이 한국 영화의 허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등'인지, 아니면 영화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는 '리부팅'의 과정인지 냉철하게 지켜볼 때다. 이 달콤한 추억 여행의 끝에서, 한국 영화는 과연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사진=판씨네마, 와이드릴리즈, 팝엔터테인먼트, CJ C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