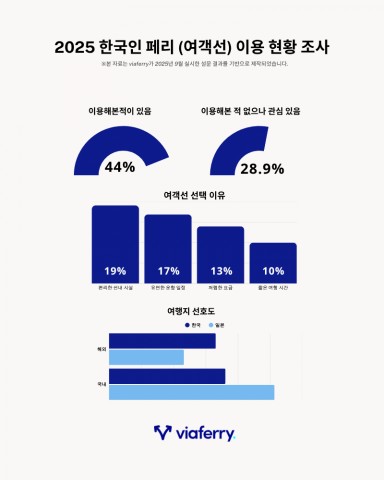(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하루에도 수없이 울려 퍼지는 자동차 경고음.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운전자는 시속 30km로 발을 떼지 못한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도, 방학으로 조용한 시골길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속도는 여전히 묶여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규제는 결국 불합리한 제도로 남는다.
1995년 도입된 스쿨존 제도는 2011년부터 시속 30km 제한으로 강화되어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은 높아졌지만, 그 운영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 보행하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 주말과 방학, 심야에도 똑같이 속도제한이 적용되며, 주민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실정은 도심과 다르다. 학생 수가 적고, 통학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와 학교 간 거리도 멀어 실제 보행 아동이 거의 없음에도 도심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결과 농촌 주민들은 과태료 부담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제도”가 “생활 불편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미 2022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심야시간대 탄력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경찰청 조사에서도 운전자와 학부모 70% 이상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이유로 농촌에서는 적용조차 어렵다. 행정이 법 규정만을 내세워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태도도 문제다.
다행히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산과 보령에서는 등·하교 시간에는 30km, 그 외 시간에는 50km로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모범 사례다.
이제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안전을 지키되 주민의 일상을 고려하는 탄력적 운영,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 행정이 먼저 현장을 살피고, 교통량과 보행자 수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은 소중하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 충남이 앞장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 스쿨존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q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