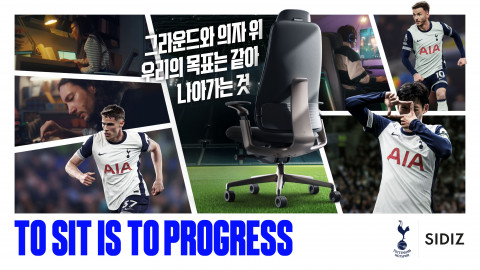좋아하는 음반 중 하나인데, 일단 재현과 창작을 번갈아 배치한 멜다우의 기획 자체가 흥미롭고, 이를 쭉 듣다 보면 트랙을 선형적으로 나열한 다른 음반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니체의 용어를 빌려 말하는 ‘영원회귀(永遠回歸)’의 무한한 시간 속을 유영 하는 듯한 기분이랄까.
바흐를 재현하고 그 배치로부터 탈주하기를 반복하는 멜다우의 사유는 단지 고전의 현대적, 혹은 재즈적 해석이라는 다소 식상한 말로 담아내기엔 아까우리만치 엄청난 우주를 품고 있다. 과거와 현재, 완결과 생성, 구조와 사건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음반에 독특한 서사적 힘을 부여한다.

멜다우는 바흐와의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 'Before Bach: Benediction'을 통해 우리의 매끈한 사유에 균열을 낸다. 그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낯선 감각은 곧 시작될 새로운 사유에 대한 ‘축복’에 다름없다. 멜다우의 틈은 단절이 아닌 생성의 공간이다. 문제 제기가 끝나면 비교적 익숙한 멜로디의 'Prelude No. 3 in C# Major from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I, BWV 848'가 연주된다.
우리가 흔히 바흐를 떠올릴 때의 명징하고, 규칙적이며, 마치 우주 질서의 축소판 같은 그 가지런한 감성이 느껴진다. 이어서 멜다우의 'After Bach: Rondo'가 연주되는데, 이 트랙에 ‘Rondo’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형식적 유사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미학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멜다우 식의 ‘차이와 반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바흐의 주제는 멜다우에 의해 반복되지만, 매번 다르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다음 트랙인 'Prelude No.1 in C Major from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II , Bmw 870'와 'After Bach: Pastorale'을 들으면 멜다우의 사유가 단지 바흐의 모티브를 재해석하는 단순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트랙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바흐의 목가적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되, 바흐가 구상했던 아르페지오의 틈을 더욱 확장한다. 그 확장된 틈은 각기 하나의 사건으로 교차하며 전혀 새로운 결의 음악을 직조한다.
균형 잡힌 시구처럼 시작되는 'Prelude No.10 in E Minor from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I, BWV 855'는 8분 음표 패턴의 멜로디가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며 점차 감정의 깊이를 드러낸다. 절제된 듯 보이지만 결코 얕지 않은 그 감정의 깊이는 후반부로 갈수록 미묘한 긴장감을 드리우며, 급기야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안까지 음습한다. 이 불안과 긴장의 여운 위에 덧붙이는 'After Bach: Flux'는 곡 전체를 압도하는,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출렁이는 역동을 보여준다. 확신에 찬 터치부터 마음을 빼앗기는데, 특히 바흐의 가지런한 시간성을 뒤틀어버리는 시간의 분절이 매력적이다.
'After Bach: Dream' 또한 앞선 'After Bach: Pastorale'처럼 전 트랙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Dream’이라는 제목은 아마도 'Prelude and Fugue No.12 in F Minor from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I, BWV 857'의 무의식적 확장, 혹은 중첩된 꿈의 세계를 암시한다. 공간감을 부각하는 몽환적 연주로 시작된 음악은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층위로 분화하고 교차한다. 무의식의 세계는 파편화된 정보들이 혼재하는 비선형적이고 순환적인 공간이다. 그 안에서 바흐의 음악은 멜다우에 의해 펼쳐지고 접히기를 반복하며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의 지형을 그린다.
'Fugue No. 16 in G Minor from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II, BWV 885' 뒤로 이어지는 'After Bach: Ostinato'는 이 앨범에서 가장 긴 트랙으로 저음부의 오스티나토 위로 펼쳐지는 멜로디와 화성의 이완과 긴장, 조화와 일그러짐이 다양한 서사적 다이내믹처럼 느껴진다. 멜다우의 오스티나토는 결코 단조롭지 않게, 강약과 밀도, 음역대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변주되지만, 동시에 고집스럽게 반복된다.

몇 년 전,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이라는 저서를 통해 재즈의 반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들뢰즈의 반복은 동일성이라는 외부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재현(Representation)에 대립한다. 반복은 오직 차이(Difference)를 만들어내기에 존재한다. 즉, 모든 차이를 긍정한다. 결국 우리는 차이를 가지기에 존재하는 것이란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그 어떤 자기 계발서보다도 값진 깨달음을 주었다.
재즈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연주자들은 시간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연주자들은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으며, 그 어떤 연주도 차이로써 긍정한다. 들뢰즈는 이를 규칙이 없는 주사위 놀이에 비유하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놀이에서는 모든 숫자가 답이 된다. 수의 위계나 내포된 의미를 고민할 필요 없이 던지는 사람은 늘 승리하는 게임인 것이다.
각 트랙을 거치며 멜다우는 바흐가, 바흐는 멜다우가 되고, ‘비포어 바흐(Before Bach)’는 ‘애프터 바흐(After Bach)’와 원환(圓環)으로 연결된다. 결국 이 앨범에서 멜다우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플라톤식 일자(一者)로서의 바흐가 아니라, 규칙이 없는 주사위 놀이가 아니었을까. 바흐의 세계는 멜다우의 사유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틈을 확장하며, 새로운 사건들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재현과 생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멜다우의 가능성의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 그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완결된 미학이 아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순간순간을 감각할 때 비로소 이 음반의 가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멜다우는 마지막 트랙 'Prayer for Healing'을 통해 현재의 안식을 기원하며, 그 평온함은 바흐에게로, 멜다우에게로, 그리고 차이의 영원회귀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로 이어진다.
글, 칼럼니스트 겸 가수 남예지
문화콘텐츠학 박사, 재즈보컬리스트, 중앙대학교 글로벌예술학부 초빙교수